고래가 부르는 노래
그녀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다. - 아름다운 그늘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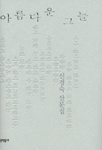 아름다운 그늘 - 아름다운 그늘 -  신경숙 지음/문학동네 |
| 도서관에 갈 때는 미리 빌려갈 도서 목록을 작성해간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가장 안전하게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손때가 묻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책도 그런 경우였다. "장미의 이름"을 간신히 읽고 나서 숨이 차 허덕이고 있었을 때, 한소끔 쉬어갈 수 있는 문학작품 한 권쯤 읽어볼까 하는 마음에 <한국소설, 수필> 코너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여러 책들 사이에서도 유독 책표지가 많이 헤져 있어서 꽤 오래된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개정판 출판일이 2004년이다. 신경숙의 에세이집 - 아름다운 그늘. 신경숙의 소설은 대학시절 도서관에서도 여러 번 들어다 놓았다를 반복했을 뿐 한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책을 들어 이리저리 펼쳐보다가 다시 꽂아놓고 2주 뒤에 다시 도서관에 갔을 때 비로서 빌리게 되었다. 이 작가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신경숙과 나의 인연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어졌다. 소설가를 소설작품으로가 아니라 에세이로 먼저 대면한다는 것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을 보기 전에 피면접자와 먼저 개인적으로 술한잔 해버리는 경우라고 할까... ^^;; 어짜피 소설이라는 것도 소설가 개인의 인생에서 퍼올러진 같은 우물물이지만, 에세이는 그야말로 거기에 설탕 한 스푼, 레몬 한 조각 안 띄운 생수인 것이다. 에세이를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그늘>은 작가의 옆에 앉아 과일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만큼 작가 자신의 일상과 생각들이 알알이 표현되어 있고, 같은 인물과 같은 에피소드, 같은 추억담이 여러 꼭지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꼭 "걔 알지? 왜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으로 시작되는 친구들과의 대화처럼 말이다. 시골에서의 유년시절이 감성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지, 그녀는 언어의 한계를 담담히 극복하고 느낌을 조곤조곤전달한다. 타인과의 교감을 시도할 때 내 생각, 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 좌절한 적이 많았다.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에쿠니 가오리의 가벼움에 잔뜩 싱거워져 버린 입맛이 감칠맛나게 돌아온 느낌. 더운 여름날, 담백하고 정갈한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깨끗하게 웃는다. 그녀때문에 한국소설이 더 읽고 싶어졌다. |
http://whalesong.tistory.com2008-08-14T11:34:330.3
'삶이 글이 될 때 > 읽고 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인을 감싸안는 공간 - 카모메 식당 (0) | 2008.09.30 |
|---|---|
| 코지 미스테리(Cozy mystery) 시리즈 - 달콤한 살인사건들?! (0) | 2008.09.11 |
| 등장인물에 대한 그녀의 변론서 - 홀리가든 (0) | 2008.08.02 |
| 표현의 근원과 만나다 -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공연 (0) | 2008.08.02 |
| 나를 지탱할 두근거림이 필요할 때 - 장미와 찔레 (0) | 2008.07.31 |


